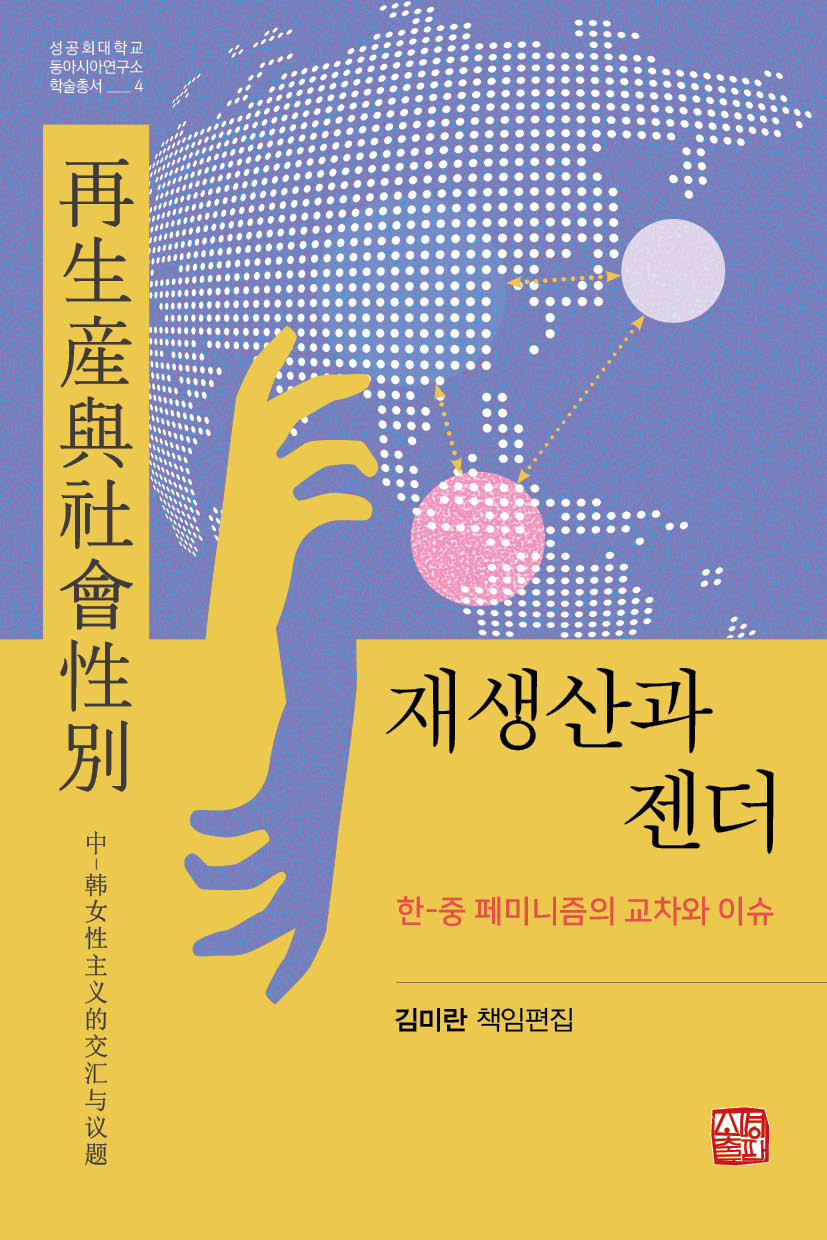출간 도서
도서 상세보기
| 저자 | 김란, 김미란(책임편집), 김양지영, 두핑, 문현아, 왕샹센, 우판, 장수지, 짱리, 펑웬 | 역자/편자 | |
|---|---|---|---|
| 발행일 | 2025-07-31 | ||
| ISBN | 979-11-5905-990-2 (93330) | ||
| 쪽수 | 392 | ||
| 판형 | 140*210 무선 | ||
| 가격 | 27,000원 | ||
2009년 한국과 중국의 여성연구자들이 첫 학술교류를 한 이후 근 20년이 흘렀다. 그동안 여섯 차례 한-중 국제 젠더학술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성과는 두 권의 책으로 만들어졌다. 첫 번째 책인 『한중 여성 트랜스내셔널하게 읽기-지식, 인구, 노동』에 이어 『재생산과 젠더』는 두 번째 책이다. 20여 년의 소통으로 기획 단계부터 상대국의 관심사를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양국의 경험을 염두에 둔 주제선택과 연구가 가시화되었다. 한국의 페미니즘 연구자가 중국사회의 경험을 염두에 두고 한국의 ‘돌봄 위기’를 분석하고, 중국의 연구자가 중국에 확산되고 있는 한국문학 열기를 한강의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하여 ‘한녀(韓女)문학’이라는 범주로 분석한 것이 그 예이다. 또한 한국의 젊은 세대의 비혼, 출산기피와 같은 현상에 조응하는 중국사회의 ‘6B’결혼, 연애 등 여섯 가지를 하지 않는 6非운동을 중국 측 연구자가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는 한국 측의 요청에 중국 연구자들이 응한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상호참조적인 연구방법이 가능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재생산의 위기’라는 양국이 직면한 고속 압축성장의 결과이다. 세대 간 격차, 젠더화된 성역할, 돌봄 부족으로 나타난 한, 중 두 나라가 직면한 현안의 근저에는 공통적으로 돌봄 노동 수행을 어렵게 하는 ‘장시간 시장노동’이 존재한다. 이에 『재생산과 젠더』는 복지가 수반되지 않은 성장위주의 급격한 사회변화가 노정한 문제를 ‘재생산과 생산’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그것을 통해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장에서 젠더의 의미와 권력구조를 재사유하고자 하였다. 출산과 돌봄, 양육, 시장노동을 역사적 맥락과 사회, 제도 전반을 통하여 살펴보되 한국과 동아시아 맥락, 특히 중국에 비중을 두어 분석하였다.
총 11편의 글로 구성된 『재생산과 젠더』는 각기 다른 시간과 공간, 주제를 다루면서도 다음의 세 가지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첫째, 재생산을 둘러싼 제도적 통치와 이데올로기가 여성의 몸과 삶을 어떻게 규율하는가. 둘째, 가족과 돌봄, 노동의 장 속에서 젠더는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고 실천되는가. 셋째, 이러한 지배 질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의 지점은 어디인가이다.
총 11편의 글 가운데 8편이 중국관련, 3편이 한국관련 연구이다. 중국 관련 글은 194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를 다루고 있으며 한국관련 글은 동시대 돌봄 위기에 집중되어 청년, 조손 간의 돌봄 문제를 다루었다. 중국여성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필자는 종종 시장화개혁 이후에 중국여성들의 ‘지위’가 마오쩌뚱 시기에 비해 높아졌는가, 아니면 낮아졌는가라는 질문을 받곤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이 글에 실린 8편의 중국관련 글을 시대 순으로 일독하기를 권한다. 전시상황인 1940년대부터 사회주의 시기, 그리고 시장화개혁 40년 동안 국가정책과 담론, 일상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에 관한 글들이 여성의 ‘노동자’ 정체성에서 ‘모성’ 정체성으로의 변화, 소비사회와 젠더관의 변화를 중심으로 대체적인 윤곽을 그릴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이다.
중국에 시장주의 시스템이 정착된 2000년 이후, 특히 2015년은 한, 중 양국 페미니스트들에게 기념비적인 해이다. 그 해에 한국사회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여성혐오와 성차별을 공적인 발화와 행동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이슈화하였고 중국에서도 여성폭력에 대한 여성들의 오랜 비판이 ‘핏빛 웨딩드레스 5인 거리시위(feminist five)’로 등장하여 2015년 ‘반反가정폭력법’ 입법으로 결실을 맺었다. 법 자체로만 본다면 한국에서 가정폭력범죄 처벌법이 1997년에 입법화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해당 법의 입법화가 다소 늦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와 당이 동일시되는 정치체제하에서 개인의 권리가 사적영역에서도 관철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사회적으로 승인된 것은 획기적인 진전이며 오랜 투쟁의 결실이라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입법화의 최전선에는 본 서 필진 가운데 한 사람인 펑웬(冯媛)의 수십 년에 걸친 여성운동가로서의 활동이 있었다. 펑웬은 관방과 거리를 둔 흔치 않은 ‘현장 여성운동가’라는 정체성을 지닌 활동가로, 본서에 한국사회의 비혼, 출산거부 운동에 준하는 중국의 6B6非운동을 소개함으로써 양국 여성운동의 교차지점을 이해하게 해 주는 글을 실었다. 국내에 최근 중국 사회 젠더문제에 대한 소개가 드물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연구가 한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 책은 역사적 시간대 순으로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슈에 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글이 짝 개념으로 배치되어 있어 젠더이슈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제1부 ‘중국사회주의와 출산 보육’ 가운데 「집단화 초기 단계의 농촌 생육 보장의 구축 경험과 현대적 시사」는 1950~1960년대 중국 농촌 집단화 초기 단계의 생육 보장 경험을 분석한 것으로 동시대 농촌의 생육정책에 참조지점을 제공한다.
제2부 ‘중국 시장화 개혁과 젠더’는 시장화 개혁 이후 여성이 노동자 정체성을 상실하고 ‘모성’으로 정의되면서 소비경쟁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맥락을 다룬다.
제3부 ‘21세기 중국과 한국의 돌봄’은 한-중 양국의 돌봄 위기를 분석한 내용으로 양국의 상황과 연구방법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제4부 ‘동시대 한중 페미니즘의 교차와 영 페미니스트운동’은 2010년 이후 중국의 페미니스트 운동과 최근 한국의 문학작품이 중국에서 수용되는 양상을 분석한다.
『재생산과 젠더』는 이상과 같이 동시대 한-중 간에 재생산과 젠더의 지형을 가로지르는 다양한 정보와 분석을 담고 있어 독자들의 사유 확장에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각 논문은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독자가 어느 장부터 읽기 시작하더라도 ‘돌봄’이라는 문제의식의 핵심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재생산과 젠더』를 통해 시장노동중심 사회에 균열을 내고 돌봄 담론에 새로운 사유를 촉발하는 것은 물론 중국사회를 젠더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제1부 | 사회주의 시기의 출산과 보육
제1장_ 집단화 초기 단계의 농촌 생육 보장의 구축 경험과 현대적 시사 -왕샹셴
제2장_ 1930~1940년대 중국 전시보육(戰時保育)의 성별 분업과 여성의 경험 -장수지
제2부 | 시장화 개혁과 젠더
제1장_ 1980년대 시장화개혁과 중국 여성-‘돌봄’과 ‘노동’담론을 중심으로 -김미란
제2장_ 개혁개방 이후 모유수유의 통치와 실천-모성과 신체를 둘러싼 엄마들의 분투 -김란
제3장_ 개혁 시기 ‘먼저 부자가 되라(先富論)’와 젠더-혼내외 여성의 생존조건과 ‘자유’ -김미란
제3부 | 개혁 시기 재생산과 젠더
제1장_ 가족 탄력성-가족 발전 능력을 확장하는 분석 프레임 -우판
제2장_ 한국 청년세대의 돌봄과 젠더평등 -문현아 (강민석·은기수·이주현·조기현)
제3장_ 돌봄 세대전가의 영향-가족과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김양지영
제4장_ 은밀하지만 강력하게-중국 도시 가정 내 조부모 세대의 권위자원이 세대 간 공동양육에 끼친 영향 -두핑 (천쟈)
제4부 | 동시대 한-중 페미니즘의 교차와 영 페미니스트운동
제1장_ 중국 내 한국 여성문학의 전파와 수용 -짱리
제2장_ 중국 여성운동의 시각에서 본 ‘6B4T’ -펑웬
필자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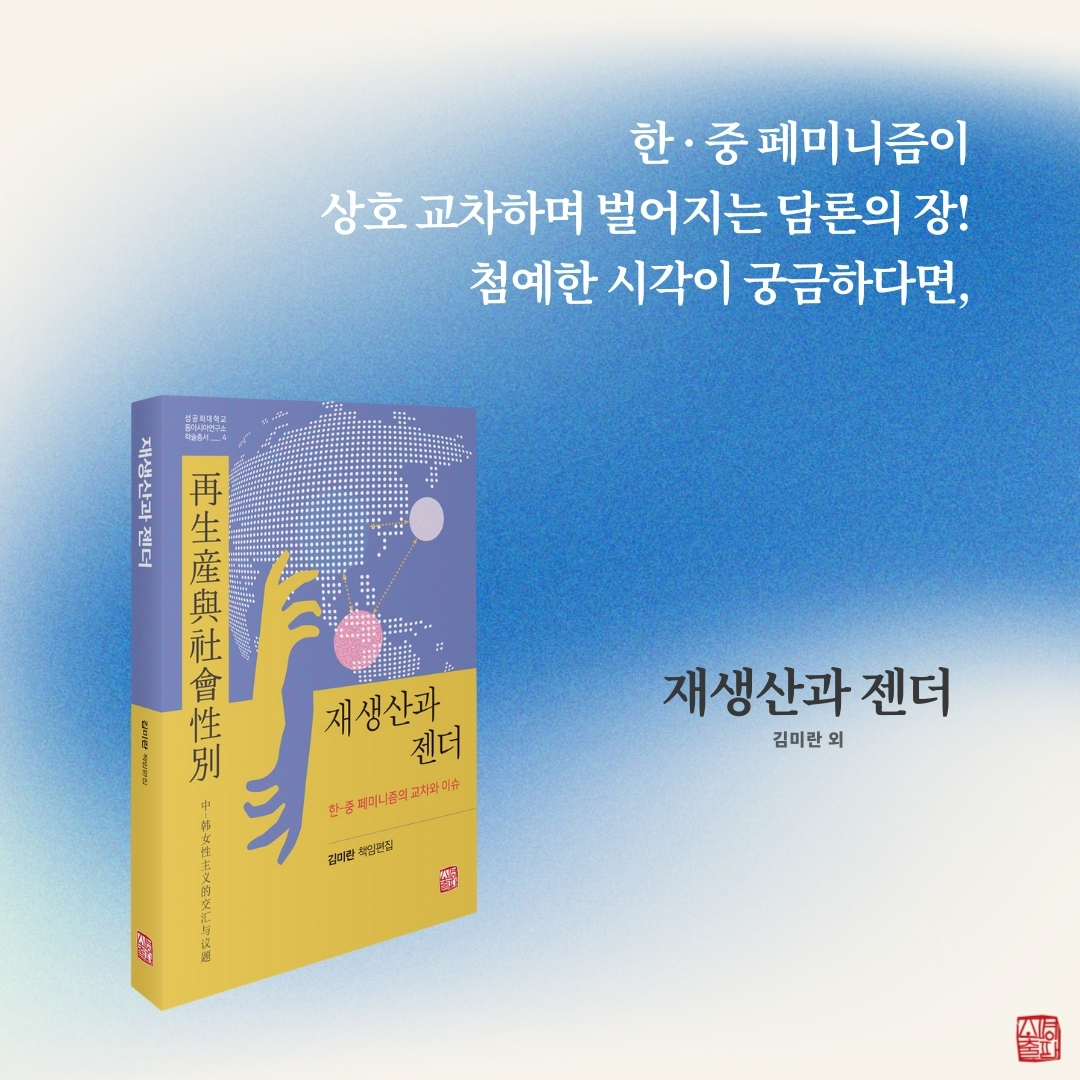
김란 金蘭, Jin Lan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원,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논문 「중국 개혁개방 이후의 모성 실천-내권적 마더링의 형성」(2023), 「중국의 ‘분투’문화를 통한 청년 통치성-선전시 분투자광장을 중심으로」(2024). 중국 가족과 보육·청년·문화 등에 대한 연구를 비교적 시각에서 수행하고 있다.
김미란 金美蘭, Kim Mi-ran
성공회대 대학원 실천여성학 교수. 저서 『현대중국여성의 삶을 찾아서』, 『한중 여성 트랜스내셔널하게 읽기-지식, 인구, 노동』(공저). 현대 중국의 여성정책과 담론, 문화를 생산과 재생산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김양지영 金梁識瑛, Kim Yang Ji-young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비정규직 통념의 해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없습니다』(공저).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노동, 가족, 정책 등을 연구했고 현재는 성평등 교육 관련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다.
두핑 杜平
중국 남개대(南開大) 사회학과 부교수, 『불평등 속의 불평등-성별 관점에서 본 중국의 이주 노동자』 젠더와 이주, 친밀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천쟈(陳佳, 상해대 부교수))
문현아 文贤雅, Moon Hyuna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원. 저서 『돌봄노동자는 누가 돌봐주나』(공저), 『페미니즘의 개념들』(공저) 등. 역서 『커밍업쇼트』(공역), 『세계화의 하인들』 등. 한국 사회 가족돌봄, 돌보는 남성성 등 돌봄 사안과 국제이주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강민석(姜旼錫,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연구원), 은기수(殷棋洙,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이주현(李周炫, 세계은행 컨설턴트), 조기현(曺技炫, 돌봄청년 커뮤니티 n인분 대표, 작가)
왕샹센 王向贤
중국 산동대 사회학과 교수, 『친밀한 관계의 폭력-1015명 사례연구』, 『父職연구』. 젠더사회학자로 노동, 출산, 돌봄과 함께 중국의 남성성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우판 吴帆
중국 난카이대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 『집단이성하의 개체행위방식연구』. 사회(가족)정책, 인구 사회학, 돌봄 및 사회 서비스 평가, 젠더 연구를 하고 있다.
장수지 張粹芝, Chang Soo-ji
이화여대 사학과 강사. 논문 「뤄충(羅瓊)의 생애로 읽어보는 중국공산당의 부녀공작」(『여성과 역사』, 2024), 「중국 첫 번째 여성 대사 딩쉐쑹의 삶과 중국 현대사의 일면」(『개념과 소통』, 2023), 「중국이 그려낸 북한여성상」(『중국학보』, 2023) 등이 있다. 중국근현대 여성운동, 여성 인물, 사회주의와 여성해방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짱리 张莉
북경사범대 문학원 교수, 북경작가협회부주석, 『역사의 지표위로 떠오르기 전-중국현대여성글쓰기의 발생』. 현대 문학비평가이며 여성문학을 주로 연구한다.
펑웬 馮媛
북경 “为平(평등을 위해)” 여성지원 핫라인 발기자, BBC가 선정한 2024년 영향력있는 세계 100인 중 1인으로 중국 페미니즘운동을 대표하는 현장활동가이다.